탈출기
| 탈출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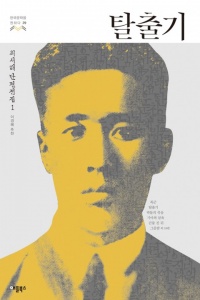
| |
| 작품명 | 탈출기 |
| 저자 | 최서해 |
| 시대 | 근대 |
| 창작년도 | 1925 |
| 성격 | 단편소설 |
| 발표매체 | 조선문단 |
개요
1925년 3월 조선문단 6호에 발표된 단편소설
1920년대 중반 소위 '신경향파 문학'의 초기 대표작으로 유명
등장 인물
줄거리
친구 '김군'이 주인공(나) '박군'에게 일도 중요하긴 하지만 타향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 아내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편지를 보냄
주인공(나) '박군'이 가족에 대한 애정과 인간적 의리라는 덕목을 저버리고 독립단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을 '김군'에게 고백 -> 위 편지에 대한 답장 형식
내(박군)'가 이역 만리 땅에서 어머니와 처자식을 곤궁 속에 버려둔 채 집을 나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던가, '나'의 친구 김군이 타이르는 편지를 수차례 보내왔다.
그의 비난은 이런 것이었다.
'군은 군의 가정에서 동량이다. ……조그마한 고통으로 집을 버리고 나선다는 것이 의지가 굳다는 박군으로서는 너무도 빈약한 소이이다. 군은 ××단에 몸을 던져 ×단에 섰다는 말을 …… 가족을 못 살리는 힘으로 어찌 사회를 건지랴.'
그래서 나는 심중에 끓어오르는 진정을 알리고자 김군에게 그 동안의 사연을 자세히 적어 보내기로 했다.
'나'는 어머니와 앳된 아내를 데리고 5년 전에 고향을 떠나 간도로 왔다. 그것은 너무도 절박한 생활에 시들어버린 탓으로 몸에 새 힘을 얻을까 하여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동경하여 실행했던 것이다. 간도엔 기름진 땅이 많고, 농사를 지어 배불리 먹으면서 글도 읽고 농민들을 가르쳐보자는 이상에 불탔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부쳐먹을 밭뙈기가 없었다. 돈을 주고 땅을 사기전에는 중국인에게 도조를 주고 빌려야 하며 양식을 꿔먹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나' 같은 시원찮아 보이는 농사꾼에겐 밭을 주려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어 H장 촌거리에서 셋방을 얻어든 후, 한 달 어름어름하는 동안에 남은 돈을 다 까먹었기에 손에 익지 않은 구들장이로 나섰다. 여름이어서 불볕 아래 삯김도 매고 꼴을 베어 팔기도 했다. 어머니와 아내는 삯방아를 찧어주었으나 이러고도 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 뼈 시리게 일을 해도 허기졌으니 아내 얻은 걸 후회하고, 세상을 원망키도 했다.
어느 날, 이틀이나 굶은 채 일자리를 찾다 돌아왔을 때 아궁이 앞에 앉았던 아내가 입을 우물거리다가 얼른 피한다. 괴이쩍어서 아궁이 속을 뒤적여보았더니 먹다 남은 귤껍질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때 아내의 배는 남산같이 불렀더랬다.
'나'는 회한과 면목이 없는 부끄러움으로 눈물을 쏟았다.
가을이 되자 찬 기운이 헐벗은 몸을 할퀴었다.
'나'는 가까스로 대구 열 마리를 살 3원을 마련하여 행상에 나섰다. 산골로 돌아다니며 대구 한 마리를 콩 한 말씩과 바꾸어, 그 콩으로 두부를 쑤어 팔게 되었다. 콧구멍 만한 부엌 방에 가마를 걸고 맷돌을 돌리자니 팔이 빠지는 듯싶고, 눅눅한 김 속인지라 흡사 옷을 입은 채 미지근한 물 속에 들어앉은 꼴이었다.
두부가 잘 만들어지면 그나마 다행이나 두부물 위에 노란 기름이 엉기지 않고 희멀끔해지고 말면 쉬어버렸다는 증거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으랴. 그런 날은 도리 없이 쉰 두부 물로 끼니를 때우고 만다. 이때쯤엔 아내가 출산을 하여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젖먹이는 마냥 빽빽거린다.
두부를 만들자면 땔나무가 많이 필요하다. 나무 살 형편이 못 되었으므로 '내'가 낫을 들고, 산후 여독으로 신음하는 아내가 뒤따르며 산으로 가 나뭇짐을 해온다. 굴러 넘어지기가 일쑤였다. 그럴 적이면 부부 누구도 제 나무를 혼자 힘으로 지거나 일 수가 없어 애를 먹는다.
뿐만 아니라, 산 임자가 있어 들키면 여간 표독스럽게 구는 게 아니다. 중국 경찰서에 여러 번 잡혀가 매를 맞기도 했다. 이러자 이웃에서는 이런 말로 비웃는다.
"흥, 신수가 멀쩡한 연놈들이 그 꼴이야. 어디 가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그 눈이 누래서 두부 장사하는 꼬락서니는 더러워서 못 보겠네."
이럴진대, '나'의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절로 움트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직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그 충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포악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는 호사를 누린다.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험악한 제도의 희생자로 지낸 것이다.
'나'는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들, 험악한 이 공기의 원류를 쳐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족이 눈 속이나 어느 구렁에서 굶어죽을 줄을 알지만 집을 나와 ××단에 가입키에 이르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