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도일과 사망) |
(→사후) |
||
| 76번째 줄: | 76번째 줄: | ||
==='''사후'''=== | ==='''사후'''=== | ||
| − | 그를 기려 출판사 문학사상사에서 [[이상문학상]]을 1977년 제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2008년에는 현대불교신문사와 계간 ‘시와 세계’가 [[이상시문학상]]을 제정해 | + | 그를 기려 출판사 문학사상사에서 [[이상문학상]]을 1977년 제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2008년에는 현대불교신문사와 계간 ‘시와 세계’가 [[이상시문학상]]을 제정해 매년 수상자를 내고 있다. 2010년에는 탄생 100주년을 맞아 생전에 발표한 작품과 사후 발굴된 작품을 포함해 그의 문학적 세계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 6월 4일 (화) 18:45 판
| 이상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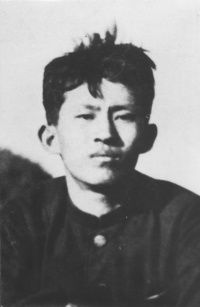
| |
| 이름 | 이상 |
| 한자 | 李箱 |
| 이칭(별칭) | 비구, 보산, 하융 등 |
| 출생 | 1910년 9월 23일 |
| 사망 | 1937년 4월 17일 (26세) |
| 출생지 | 일제 강점기 경성부 서서 인달방 사직동계 사직동 |
| 학력 |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부 |
| 분야 | 소설, 시, 수필, [[삽화가], 건축 |
| 단체 | 구인회, 조선총독부 |
이상(李箱, 1910년 9월 23일 ~ 1937년 4월 17일)은 일제 강점기의 시인, 작가, 소설가, 수필가, 건축가로 일제 강점기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작가이자 아방가르드 문학가이다. 본명이 김해경(金海卿)이며 본관이 강릉 김씨(江陵 金氏)이다. 난해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한 시인 겸 소설가. 건축 일을 하기도 하였다. 《날개》를 발표하여 큰 화제를 일으켰고 같은해에 《동해(童骸)》, 《봉별기(逢別記)》 등을 발표하였다. 그는 시, 소설, 수필에 걸쳐 두루 작품 활동을 한 일제 식민지시대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특히 그의 시와 소설은 1930년대 모더니즘의 특성을 첨예하게 드러내준다.
약력
학력사항
- 신명학교
- 동광학교
- 1922년 ~ 보성고등보통학교
- 1929년 ~1929년 경성고등공업학교 - 건축학
경력사항
-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수로 근무
- 1934년 ~ 구인회 활동
- 1936년 ~ 구본웅이 경영하는 창문사에서 시와소설 편집
생애 및 활동사항
생애초기
경성부 북부 순화방 반정동 4통 6호에서 부친 김영창(金演昌)과 모친 박세창(朴世昌)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김해경(金海卿), 본관은 강릉이다. 제적부에 기재된 본적은 경성부 통동(이후 통인동으로 개칭) 154번지다. 형제로 누이동생 김옥희와 남동생 김윤경이 있다. 김영창은 일본 강점 전 구한말 당시 궁내부 활판소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뒤 일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이발관을 개업, 가계를 꾸렸다. 1913년, 백부 김연필은 본처 사이에 소생이 없던 차에 조카인 이상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우고 학업을 도왔다. 1917년 여덟 살 되던 해 누상동의 신명학교에 입학했다. 재학 중, 화가 구본웅과 동기생이 되어 오랜 친구로 이어졌다. 1921년 신명학교를 졸업한 뒤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경영한 동경학교에 입학했다. 1922년 동광학교가 보통학교와 합병되자 보성고보에 편입했다. 재학 중에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화가 지망생이 되었으며 학업 서적도 상급 수준에 닿았다. 1925년 교내 미술전람회에서 유화 〈풍경〉이 입선했다. 1926년 3월 보성고보 제4회 졸업생이 되었다. 같은 해 경성 동숭동의 관립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부에 입학했다. 1929년 동 학교 건축과를 수석 졸업했다. 졸업기념 사진첩에 본명 대신 이상(李箱)이라는 별명을 썼는데, 구본웅에게 선물로 받은 화구상자(畵具箱子)에서 연유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때 받은 화구상자가 오얏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였기 때문에 이상(李箱)은 '오얏나무 상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취직과 등단
1929년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부를 수석으로 졸업하자 학교의 추천으로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수로 발령을 받았다. 이해 11월 조선총독부 관방회계과 영선계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건축기술자를 축으로 1922년 3월 결성된 조선건축회에 정회원으로 가입, 이 학회의 일본어 학회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의 표지 도안 현상 모집에 1등과 3등으로 당선되었다. 1930년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일반에게 홍보하기 위해 펴내던 잡지 《조선》 국문판에 2월호부터 12월호까지 9회에 걸쳐 데뷔작이자 유일한 장편소설 《12월 12일》을 필명 이상(李箱) 아래 연재하였다. 1931년 6월,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서양화 〈자상〉이 입선했다. 같은 해 《조선과 건축》에 일본어로 쓴 시 〈이상한가역반응〉 등 20여편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1932년 《조선과 건축》에 〈건축무한육면각체〉 제하에 일본어 시 〈AU MAGASIN DE NOUVEAUTES〉, 〈출판법〉 등을 발표했다. 《조선》에 단편소설 〈지도의 암실〉을 비구(比久) 필명으로 발표하고 단편소설 〈휴업과 사정〉을 보산(甫山) 필명으로 잇달아 발표했다. 동년 《조선과 건축》 표지 도안 현상 공모에서 가작 4석으로 입상했다.
병고
1931년 이상은 폐결핵 감염 사실을 진단받았고 병의 증세는 점차 악화되었다. 1933년 폐결핵으로 직무를 수행키 어렵게 되자 기수직에서 물러앉고 봄에 황해도 배천 온천에서 요양하였다. 이곳에서 알게 된 기생 금홍을 서울로 불러올려 종로 1가에 다방 제비를 개업하며 동거하였다. 같은 해 문학단체 구인회의 핵심 동인인 이태준,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등과 교유를 트고 정지용의 주선을 통해 잡지 《가톨닉청년》에 〈꽃나무〉, 〈이런 시〉 등을 국문으로 발표했다. 이듬해 이태준의 도움으로 시 〈오감도〉를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지만, 15편을 발표한 후 너무도 원색성 짙은 성적 표현이 끝내 독자들의 항의와 비난에 시달림으로 힘입어 연재를 중도 작파하였다. 같은 해 동 잡지에서 연재된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아호 하융(河戎) 아래 삽화를 그렸다. 1935년 다방 제비를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금홍과 결별한다. 인사동의 카페 쓰루(鶴)와 다방 69를 개업 양도하고 명동에서 다방 무기[參]를 경영하다 문을 닫은 후 성천, 인천 등지를 표표하였다.
도일과 사망
1936년 구본웅의 알선으로 창문사에 근무하면서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 창간호를 편집 발간했다. 단편소설 〈지주회시〉, 〈날개〉를 발표하면서 평단의 관심을 받았다. 이해 연작시 〈역단〉을 발표하고 〈위독〉을 《조선일보》에 연재하며 가장 생산적인 한 해를 보냈다. 6월 변동림과 결혼, 경성 황금정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10월 하순 새로운 문학 세계를 좇아 도일했다. 동경에서 삼사문학의 동인 신백수, 이시우, 정현웅, 조풍연 등을 자주 만나 문학을 토론했다. 이듬해 단편소설 〈동해〉, 〈종생기〉를 발표했다. 1937년 2월 사상 혐의로 동경 니시간다 경찰서에서 피검된 후 한 달 정도 조사를 받다 폐결핵 악화로 보석으로 출감한 뒤 동경제국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했다. 4월 17일 동경제대 부속병원에서 2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위독하다는 급보를 듣고 일본으로 건너온 부인 변동림이 유해를 화장하고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말년의 이상은 술과 여자를 즐겼다고 한다. 동료 문인이자 친구인 박태원은 이상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계집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벗을 사랑하고 또 문학을 사랑하였으면서도 그것의 절반도 제 몸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면서 "이상의 이번 죽음은 이름을 병사에 빌었을 뿐이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역시 일종의 자살이 아니었든가 - 그러한 의혹이 농후하여진다."고 하기도 했다.
사후
그를 기려 출판사 문학사상사에서 이상문학상을 1977년 제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2008년에는 현대불교신문사와 계간 ‘시와 세계’가 이상시문학상을 제정해 매년 수상자를 내고 있다. 2010년에는 탄생 100주년을 맞아 생전에 발표한 작품과 사후 발굴된 작품을 포함해 그의 문학적 세계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